[박해현의 문학산책]
봄의 길목에서 만난 詩人 함민복과 기형도
지리산엔 매화가 폈는데 50세 친구는 늦장가 가고
요절한 벗 묘소 앞에선 추모 낭독회가 열렸다
봄은 산 자와 죽은 자 구별없이 모두 축복한다
버들치는 우리나라 하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민물고기다. 버들가지 아래에 떼를 지어 몰려 산다. 지리산 동매마을에 사는 박남준 시인의 별명은 '버들치 시인'이다. 성품이 온순한 버들치처럼 여리게 생겼고, 버들치가 사는 강물 오염을 줄이려고 세제도 잘 쓰지 않기 때문이다. 꽃샘추위가 매섭지만 최근 그의 집 마당에 홍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이다. 통영에 사는 이진우 시인이 며칠 전 놀러 갔다가 홍매화를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동매마을, 볕 참 따뜻하다'고 했다. 역시 지리산 하동에 사는 이원규 시인에게 섬진강 꽃소식을 물었더니 "매화가 작년보다 보름 늦게 피기 시작했다"고 했다. 봄의 전령인 황어떼가 올라오자 벌써부터 낚시꾼들이 몰린다고 한다.
전북 임실에 사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에게도 꽃소식을 물었다. "꽃샘추위 땜에 아직 여기는 일렀어. 하동하고 여기는 달라. 피려면 좀 더 있어야 혀." 섬진강 시인은 지난해 윤정희가 열연한 영화 '시'에서 '김용탁' 시인으로 나왔다. 내가 "연기를 참 잘 하시길래 대종상 신인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으셨대요"라고 하자, 그는 "글쎄 말이여, 나 참…"이라며 깔깔 웃었다. 섬진강 물소리가 묻은 목소리였다. 20여년 전 시골 학교 교사였던 그가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는 소문이 서울 문단까지 올라왔다. 서울 글쟁이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차라리 소나 타지"라고 했다. 김용택은 섬진강변에서 소달구지를 타고 다녀야 제맛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우스갯소리였다.
지난 일요일 함민복 시인이 나이 오십에 동갑내기 신부를 맞아 결혼식을 올렸다. 한때 강화도에서 월세 10만원짜리 집에서 홀로 살았던 함민복은 늘 궁핍한 시인의 대명사로 통했다. 당시 그는 한 달 담뱃값으로 월세보다 많은 15만원을 쓰면서 "집아, 고맙다"고 했다. 한 번은 그가 맛에 관한 에세이를 청탁받았는데, 갑자기 '모든 맛의 기본은 젖맛'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런데 엄마젖은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고,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 젖내음을 맡아보지 못해 도저히 글이 써지지 않았다. 산부인과 의사를 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라며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젖맛을 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선배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는 쑥스러워 찾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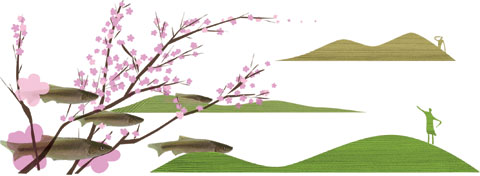
- ▲ 일러스트=정인성 기자 1008is@chosun.com
그가 영원히 총각으로 살 뻔하다가 다행히 늦장가를 가는 날 예식장을 찾았다. 신랑에게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의 눈이 매우 충혈된 상태였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쁜 신랑을 놓아주고 다른 시인들 곁으로 갔다. 내가 "새신랑 눈이 왜 저렇게 빨개?"라고 하자 한 시인은 "오늘을 얼마나 눈이 빠지게 기다렸겠어요"라며 웃었다.
함민복 시인의 결혼식 전날 기형도 시인 묘소를 찾았다. 그는 1989년 3월 7일 서른 살 생일을 엿새 앞두고 뇌졸중으로 세상을 떴다. 그의 오랜 벗 성석제를 비롯한 후배 몇몇이 모였다. 후배 작가 황경신은 기형도의 시 '질투는 나의 힘'을 낭독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라며 끝나는 시다. 누군가를 질투하면서 미친 듯이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는 게 청춘의 욕망이다. 광기와 사랑, 방황 그리고 자기 회의는 젊은이가 자신을 치열하게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질투는 청춘의 힘이다. 기형도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 '입 속의 검은 잎'은 지금까지 24만부 넘게 찍었다. 젊은 날의 낭만과 우울, 환상과 환멸이 담긴 기형도 시 세계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영원한 청춘의 비가(悲歌)처럼 읽힌다.
가수 배인숙이 부른 가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는 프랑스 샹송에서 멜로디를 따왔다. 알랭 바리에르가 시인(詩人)을 예찬한 노래 '앵 포에트'가 원곡이다. 배인숙의 노래는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며 옛사랑을 추억하지만 '앵 포에트' 노랫말은 전혀 다르다. '시인은 그리 오래 살지 않네/ 그는 게걸스레 삶을 씹어먹고/ 동시에 잉크를 남김없이 써 버리네/(…)/ 시인은 아주 오래 사네/ 겨울마다, 봄마다 시인의 수많은 아이들이 예언자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태어나네/ 시인은 아주 오래 사네.'
시인 기형도는 요절했지만 해마다 3월이면 친구들 가슴 속에서 되살아난다. 봄을 맞아 장가를 간 함민복도 시인들이 모일 자리를 마련했다. 봄날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 없이 축복한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생사(生死)의 경계는 녹아내린다. 그래서 시인들은 꽃이 피면 미친 듯이 황홀해하고, 꽃이 지면 '봄날은 간다'를 슬프게 부르나 보다.
'별처럼 바람처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삶의 속도를 늦춰보세요. 세상이 달라져보여요 (0) | 2011.03.13 |
|---|---|
| 일본의 지진 대응 (0) | 2011.03.13 |
| 연가 4-마종기 /Salento (0) | 2011.03.09 |
| 자신을 향한 남자의 집착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미친거니.. (0) | 2011.03.08 |
| 선교사의 편지 /Iva Zanicchi / Un Fiume Amaro (쓸쓸한 강) (0) | 2011.03.08 |
